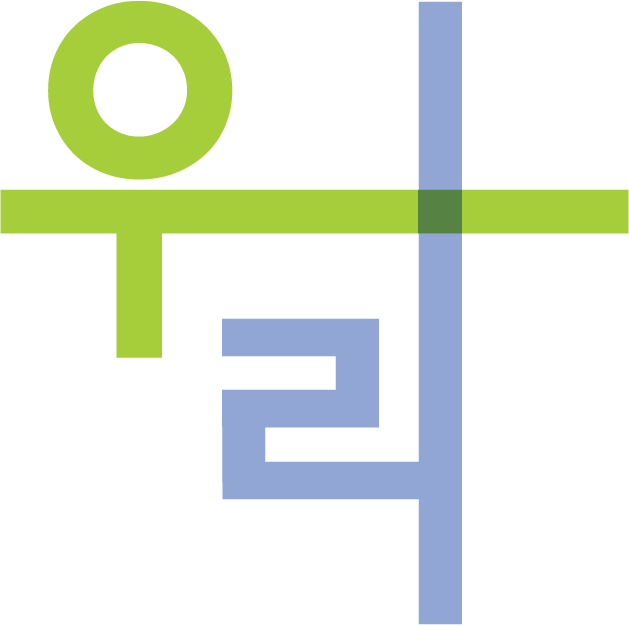연재글 조원태 목사의 '요나서로 묻는 17개 질문' - 하나님이 보내신 바람 (뉴스앤조이) 2025-4-20
페이지 정보

본문
요나서로 묻는 17개의 질문
도망자에게, 묻고 계십니다.
왜 막으시나? (요나 1:4)
 조원태 목사 @ 미주뉴스앤조이.
조원태 목사 @ 미주뉴스앤조이.그날 바다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숨을 죽이고 있었다. 욥바의 낡은 항구는 긴 꿈에서 막 깨어난 사람처럼 나른했고, 출항은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부드럽고 평온했다. 바다는 천천히 숨을 쉬듯, 숨을 들이마시는 것과 내쉬는 것 사이의 틈처럼 조용했고, 누구도 그 틈에 깃든 예언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러나 바다는 오래도록 잠들지 않는다. 하늘과 바다가 맞닿는 선을 넘는 순간, 고요는 금이 가듯 조용히 부서졌다. 물결이 들숨처럼 부풀어 오르더니, 이내 참지 못한 듯 터져버렸고, 바다는 하늘을 향해 울먹이며 몸을 일으켰다. 울부짖는다기보다, 오래 꾹 눌러왔던 한숨이 물살로 번진 듯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 1:4)
바다는 한순간에 그 얼굴을 바꾸었다. 수평선 너머에서 먼저 어두워진 하늘이 달려오고, 바람은 물살을 가르며 쏟아졌다. 돛이 찢어지고, 밧줄이 울었다. 파도는 하늘을 삼킬 듯 솟구치고, 배는 자신이 부서지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휘청거렸다. 모든 소리가 뒤섞였고, 그 와중에도 가장 분명한 것은 하나—하나님이 바람을 내리셨다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기상 현상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신 방식이었다. 이 폭풍은 단지 바다를 뒤집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흔들어 깨웠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요나는 그 바람을 모른 척했을 것이다. 아니, 외면하려 애썼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바람은 단순한 날씨의 변덕이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바다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오래된 통곡이었고, 억눌린 연민이었고, 잊힌 약속이었다. 물속 어딘가에서 오래 전부터 숨죽이며 기다리던 바람 하나가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선 것이다.
그 바람은 날카로운 창끝처럼 정확했고, 한없이 부드러운 연인의 손길처럼 다정했다. 하나님이 숨결로 빚은 바람은 무섭게 흔들었지만, 동시에 꺾이지 않도록 감싸 안았다. 그것은 징벌이 아니라 손짓이었고, 책망이 아니라 품어 안음이었다. 바람은 오래 연습한 무용수처럼 자신의 동선을 따라, 흔들리지 않고 요나를 향해 걸어왔다. 그 궤적은 오직 하나, 회피할 수 없는 부르심이었다.
배가 거의 깨지게 된 이유
히브리어로 ‘헤틸(הֵטִיל)’이라는 말은 ‘거칠게 던지다’는 뜻이다.[1] 사울이 분노하며 단창을 던질 때 사용했던 말이다(삼상 20:33). 하지만 이 단어는 단순한 분노의 동작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마음을 겨냥한 오래된 망설임, 물러섬 없는 결심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목적을 정확히 조준한 정교한 손길이었다. 하나님은 무작위로 바람을 흩뿌리지 않으셨다. 바람은 마치 정교한 활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요나를 향해 정확히 던져졌다.
그 배 위에서, 나는 요나였다.
나의 시작은 고아원의 담장 안이었다. 담장은 낮았지만, 세상은 멀었다. 어머니는 계셨지만, 형편상 나를 곁에 두실 수 없었다. 서울의 작은 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기시던 어머니가 너무도 그리웠던 어느 겨울, 초등학교 6학년이던 나는 주소 하나를 손에 쥐고, 생애 처음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길은 낯설었고, 마음은 더 추웠다. 외투 하나 없이 얇은 옷차림으로, 눈이 펑펑 쏟아지던 날이었다.
종일 역삼동 일대를 헤매던 나는 어스름이 깔릴 무렵, 마침내 어머니가 계신 상가 2층 교회를 찾아냈다. 그곳에서 어머니는 교회 의자를 침상 삼아, 이불 하나로 겨울을 견디고 계셨다. 연락도 없이 나타난 새카만 얼굴의 아들을 본 어머니의 눈빛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한다.
그날 밤, 나는 어머니 품에 안겨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상 위에는 식은 밥 한 덩이, 간장, 시큼한 묵은 김치 몇 조각 뿐이었다. “어머니는요?” 내가 묻자, 어머니는 이미 드셨다고 하셨지만, 그것은 내 몫을 내어 주신 말이었다. 그때 어머니가 차려준 그 아침은, 지금껏 내 인생에서 받은 가장 조용한 성찬이었다. 시큼한 김치와 식은 밥, 간장 한 숟갈이었지만, 그 아침은 내 삶에 한 번도 없던 잔잔한 잔치였다. 소박했으나 눈물 나게 귀했고, 말은 없었지만 축복 같았다. 그 모든 것이 한 끼의 음식이 아니라, 오래 기다리던 품 같았고, 사랑이 밥이 되어 내게로 온 것 같았다.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다. 강남터미널 지하 꽃시장을 어머니와 지나고 있었다. 나는 언젠가 다시 만나면 꼭 드리리라 마음먹었다. 신문 배달하며 손바닥에 피멍 들던 새벽마다 모은 2만 원. 그 돈을 어머니 손에 쥐여드렸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다. 터미널 기둥 아래 쪼그려 앉아, 나는 눈을 맞으며 하염없이 울었다. 아무도 없던 그 자리, 기댈 곳이라곤 차가운 기둥 하나뿐이었다. 그 기둥은 마치 요나가 몸을 숨긴 배 밑바닥 같았다. 누구도 없는 곳,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이 멈춘 곳.
그때 하나님은 속삭이셨다. “아이야, 내가 너를 보고 있단다. 아무도 너를 보지 않아도 너는 나의 아들이란다. 강하고 담대하렴.”
그 한마디는 바람이었다. 울음을 멈추게 하는 바람이 아니라, 다 울고 난 뒤에도 조용히 남아 품어주는 바람. 하나님이 보내신 바람이었다. 나는 요나처럼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내게는 길이 없었고, 돌이킬 여백도 없었다. 배가 거의 깨지기 직전, 선택 아닌 몰림의 자리에서 그 바람은 나를 겨냥해 불어왔고, 결국 멈추어 기도하게 만든 하나님의 옷자락이었다.
요나서 연구의 권위자 잭 M. 새슨은 히브리어 본문에서 폭풍이 하나님의 정밀한 개입임을 읽어낸다.[2] 랍비 문헌에서는 하나님께서 폭풍을 요나가 탄 배 주변에 한정했다고 한다.[3] 이 바람은 바다를 건너던 사람들의 안전한 일상을 흔들어 깨웠다. 모두가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고 믿었던 그 배 위에서, 바람은 배를 거의 깨뜨릴 정도로 몰아붙였다. 평화롭게만 보이던 사회의 이면에 숨어있던 갈등과 분열, 불편한 진실처럼 그 바람은 모든 것을 흔들었다.
우리 시대에도 바람이 불고 있다. 고요해 보이는 사회의 표면 아래 인종차별, 빈부격차, 환경 파괴 같은 거대한 균열이 배처럼 흔들리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주하기 두려워 피하고 싶었던 그 진실을 바람처럼 던지신다.
그 바람은 꺾이지 않도록, 부서지지 않도록, 등을 조용히 감싸는 하나님의 옷자락이었다.
그 배 위에서, 당신은 요나였는지도 모른다.
나만 그랬던 건 아니니까. 이 세상 곳곳에 정조준 된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다. 누구에게는 해고 통지서로, 누구에게는 병명으로, 누구에게는 사랑의 붕괴로 다가오는 바람들. 그것은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 방향을 잃은 이들을 붙들어 세우는 하나님의 묵직한 숨결이다.
바람은 부수기 위해서가 아니라, 흔들기 위해 불어온다. 하나님의 바람은 실패한 선택과 어긋난 결심, 절망 속에서도 다시 길을 내신다. 요나는 배 밑바닥에서 잠들어 있었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계셨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잠든 채 바람을 맞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끝내 도달하신다. 그 바람은 단지 흔드는 것이 아니라, 길을 묻는 질문이다. 우리가 도망치려는 그 방향으로조차 하나님은 함께 움직이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의 흔들림은 끝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초대다. 하나님의 바람은 방향을 잃은 이들에게 가장 정직한 나침반이 된다.
큰 바람, 깊은 초대
하나님이 보내신 바람은 언제나 사람만을 겨냥하지 않는다. 그 바람은 도시를 향했고, 공동체를 향했고, 시대를 가로질렀다. 요나가 받은 부르심은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한 도시 전체의 운명을 바꾸기 위한 것이었다. 바람은 그런 방식으로 불어왔다. 한 사람을 흔들어,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 흔들림은 파문이 되어 바다를 건넜고, 누군가의 심장을 지나, 하나의 길이 되었다. 요나는 배에서 던져졌지만, 예수는 십자가 위로 들려졌다. 한 사람의 침묵은 도시를 살렸고, 한 사람의 희생은 세상을 품었다(요 11:50). 요나의 표적은 결국, 십자가를 향해 꺾이는 인간의 마음을 이끄는 고요한 이정표였다(마 12:39).
요나가 도망쳤을 때, 흔들린 것은 그의 삶만이 아니었다. 그 배 위에는 신을 부르며 아우성치던 이방인들이 있었고, 바람은 그들의 마음까지 흔들었다. 그 바람이 어떻게 기도로 바뀌었는지는, 다음 이야기 속에서 밝혀진다. 그의 불순종조차도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길이 되었다. 폭풍은 한 사람의 도피를 공동체의 회심으로 전환시킨 하나님의 신비였다.[4]
오늘날도 우리는 각자의 배에 올라 있다. 누군가는 도망치고 있고, 누군가는 고요함 속에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간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바람을 보내신다. 폭풍은 여전히 우리 삶에 찾아오고, 신앙을 흔들고, 구조를 바꾸고, 마음을 열게 한다. 그 바람은 때로 진실을 드러내는 사건의 형태로, 때로는 불편한 질문으로, 때로는 억눌린 이들의 울부짖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 바람이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라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부르더호프 공동체(Bruderhof)의 아이들이 쓴 문장이 떠오른다.
“장애물은 길을 막지 않는다. 그것이 곧 길이다.”(Obstacles do not block the path. They are the path)[5]
막히는 곳에서 우리는 돌아서기 마련이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길 삼으신다. 요나의 막힘은 우회가 아니라 초대였다. 배가 흔들리고, 마음이 요동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막으심으로 초대하신다. 우리가 닫힌 문 앞에 멈출 때, 하나님은 그 막힘을 여는 새로운 방향이 되신다. 그 바람은 우리를 돌아서게 하거나 밀어내기보다, 부드럽게 불어와 안으로 이끈다. 흔들림은 끝이 아니라, 다시 걷기 위한 숨 고르기 였다.
바람은 옷자락이었다
조원태
나는 달아나는 줄 알았다
그러나 당신은 고요히
나를 겨냥하여 바람을 던지셨다
그 바람,
결코 우연이 아니었고
큰 도시 대신
더 큰 폭풍이 나를 삼켰다
내가 택한 항로는
당신이 미리 그어둔 동심원 안에 있었고
당신의 뜻은 한 걸음도
물러서는 법이 없었다
막힌다는 건
뒤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쪽으로 이끌리는 것
나는 그것을 너무 늦게야 깨달았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나 아닌 누군가가
당신을 바라보며 무릎 꿇었다
나의 잘못이 타인의 기도를 낳고
나의 도피가 누군가의 회심을 꽃피웠다
당신의 바람은 공평하게 불었고
아무도 예외가 되지 못했다
폭풍 한복판에서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길이 열리고 있었음을
막힌 자리마다
당신의 자비가 숨 쉬고 있었다
그 옷자락, 그 바람나를 향해 조준된 흔들림 속에서
나는 결국 나 자신을 마주했다
그리고 당신의 옷자락은
바람이 되어 나를 감싸 안았다
막힌 길 너머
따스하게, 깊이, 흔들림 없이
당신은 이미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 이 글의 시 「바람은 옷자락이었다」은 저자의 자작시입니다.
주)
[1] Jack M. Sasson, Jonah: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Commentary, and Interpretatio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0), pp. 90–93.
[2] Ibid., p. 92. [3] Ibid., p. 93.
[4] 팀 켈러, 『방탕한 선지자: 요나와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 두란노, 2019, pp. 43–45.
[5] 부르더호프(Bruderhof)는 뉴욕주를 비롯한 전 세계에 분포한 기독교 공동체로, 재산을 공유하며 공동 생산과 공동 양육, 비폭력과 평화의 가치를 실천하는 평화주의적 공동체이다. 본문에 인용한 글귀는 2024년 10월 26일, 필자가 교회의 소그룹 리더들과 함께 뉴욕주의 부르더호프 공동체를 방문했을 때 직접 확인한 것이다.
조원태 목사 / <뉴욕우리교회>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이전글2025년 4월 20일 25.04.20
- 다음글도망치는 예언자, 요나 (뉴스앤조이) 2025-4-15 2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