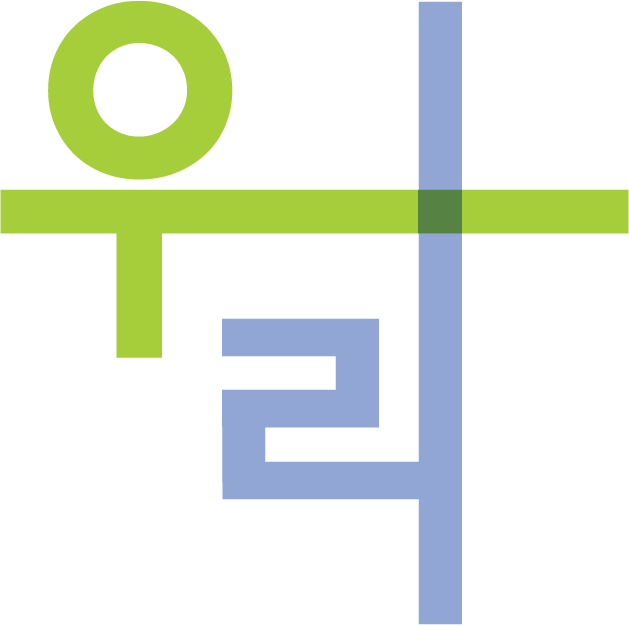연재글 [문지방에서 시작되는 큰 이야기] 구원, 꺾인 몸에서 열리는 문 (뉴스앤조이) 2026-1-22
페이지 정보

본문
구원, 꺾인 몸에서 열리는 문
조원태목사의 [문지방에서 시작되는 큰 이야기]
출애굽기 1:1-7
야곱과 함께 각기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칠십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출애굽기의 첫 장면에는 불도 바다도 없다. 바다가 갈라지기 전, 재앙이 시작되기 전, 이 책은 뜻밖에도 조용하다. 다만 이름들이 하나씩 불린다.
“야곱과 함께 각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출 1:1).
히브리어 성서 전통에서 이 책은 오랫동안 우리가 아는 ‘출애굽기’가 아니라, 첫 단어를 따라 쉐모트(‘이름들’)로 불려 왔다. 이 책이 무엇으로 시작하는지를 말해 주는 이름이다. 아직 민족도, 나라도, 역사적 주체도 아니다. 다만 기억되고 불린 이름들이다. 출애굽기는 바로 그 미미한 출발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 도입은 우연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언제나 극적인 탈출 장면보다 먼저, 이름이 다시 불리는 순간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아직 그대로인 듯 보이지만, 더는 그대로일 수 없음을 마음 깊이 알아차리는 때—구원은 바로 그 인식의 틈에서 필요해진다.
칠십이라는 시작
그 이름들 옆에 덧붙여진 숫자가 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칠십이요.”(출 1:5) 출애굽기의 시작에 놓인 수는 웅장하지 않다. 제국을 뒤흔들 숫자도, 혁명을 예고하는 통계도 아니다.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 가족, 고작 칠십 명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 숫자를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집이 칠십 명이었다는 기억은 창세기의 끝자락에 다시 호출되고(창 46:27), 광야 한가운데서도 반복된다(신 10:22).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전승이 ‘일흔다섯 명’이라는 표현으로 다시 한 번 변주되어 소환된다(행 7:14).
시작의 숫자가 사라지지 않고 되풀이되어 불린다는 사실 자체가 이 이야기의 성격을 드러낸다. 하나님은 늘 많음에서가 아니라 씨앗에서 이야기를 시작하신다. 완성된 규모가 아니라, 아직 자라야 할 시작점에서 역사를 여신다.
더 주목할 것은 이 칠십이 단일한 혈통의 순수한 집합이 아니라는 점이다.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여종 실바와 빌하에게서 태어난 서로 다른 후손들이 한 숫자로 기억된다. 출애굽기의 서문은 처음부터 말한다. 이 공동체는 균질함으로 묶인 집단이 아니라, 차이와 긴장을 품은 채 한 약속 아래 불려 나온 이름들의 연합이라고.
이름들 곁에 붙은 ‘칠십’이라는 숫자가 기억되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들은 많아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약속을 맡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출애굽기의 서문은 이 작은 수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오래된 약속의 궤적 위에 올려놓는다. 큰 민족이 되리라는 약속, 땅의 티끌과 하늘의 별에 비유된 약속은 언제나 ‘아직 작을 때’ 먼저 주어졌다.
출애굽기 1장은 그 약속이 소멸되지 않았음을 짧게 증언한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사라진 뒤에도 이름들은 끊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해졌다(출 1:7). 약속은 숫자를 키운 것이 아니라, 시간을 견디게 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 앞에 서게 된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가로 공동체를 재단하지만, 출애굽기의 서문은 다른 질문을 던진다. 무엇을 믿고 있는가. 구원은 언제나 소수에서 시작되었고, 그 소수는 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다.
허리가 꺾인 자리에서
그러나 출애굽기 서문이 끝내 붙잡는 질문은 숫자 그 자체가 아니다. 이 칠십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것이다. 본문은 단정하듯 말한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칠십이요”(출 1:5). 출애굽의 씨앗은 통계가 아니라, 한 몸에서 나왔다.
히브리어로 이 ‘허리’는 예렠이다. 창세기 32장, 야곱이 얍복강에서 씨름하다 위골된 바로 그 자리, 환도뼈를 가리키는 말이다. 흥미롭게도 출애굽기 1장의 ‘야곱의 허리’와 창세기 32장의 ‘야곱의 환도뼈’는 같은 표현이다. 출애굽기의 시작은 이렇게 들린다. 칠십 명은 야곱의 환도뼈에서 태어났다.
예렠은 본래 생식의 자리, 약속이 이어지는 자리였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 명할 때, 종이 환도뼈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했던 이유도 그 때문이다(창 24:2, 9). 그러나 야곱에게 그 자리는 무너졌다. 위골된 허리, 더 이상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자리였다.
그런데 바로 그 무너진 자리에서 출애굽의 씨앗이 태어났다.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신다. “많은 국민과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창 35:11) 출애굽기 1장은 그 약속의 성취를 기록한다. 무너진 허리에서 나온 칠십 명. 출애굽기는 처음부터 분명히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가능성이 남아 있는 자리에서가 아니라, 이미 꺾인 자리에서 시작된다고.
그래서 이 책은 아직 아무것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한다. 출애굽기가 구원의 책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구원은 완성의 장식이 아니라,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에 비로소 삶을 흔드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패배한 몸에서 열리는 출구
우리는 이 서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게 된다. 우리는 체계 안에서 살아남는 법을 익혔고, 어느 정도의 안정도 확보했다. 그러나 출애굽기는 묻는다. 지금 당신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가, 아니면 역할과 기능으로 대체되고 있는가?
출애굽기의 구원은 억압의 절정에서 갑자기 등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익숙함이 질문을 지워버린 자리, 아직은 견딜 만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던 순간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기적의 연대기가 아니라 문지방의 기록이다. 떠나지도, 머물지도 못한 채 서 있던 경계의 시간 말이다.
아직 애굽에 머물러 있지만, 아직 노예로 불리지는 않는 사람들. 그러나 이미 자유를 질문하지 않게 된 사람들. 출애굽기의 구원은 바로 이 애매한 지점에서 시작된다. 억압이 제도화되기 전, 채찍이 일상이 되기 전, 사람들은 스스로를 설득하며 말한다. 아직은 괜찮다고, 견딜 만하다고. 그 순간 자유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질문되지 않을 뿐이다.
출애굽기는 바로 그 침묵의 시간을 기록한다. 아직 출구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출발은 시작된 상태. 그래서 이 책의 구원은 눈앞의 기적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하지 않으려는 삶을 흔드는 호출로 다가온다.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되었다고.
무너진 몸이 기억이 되다
출애굽기 서문이 기억해 내는 것은 혈통의 목록이 아니라 한 사람의 몸이다. 야곱의 허리, 이미 무너져야 했던 자리다. 그는 이민자였고, 야망의 사람이었다. 더 인정받고 더 확보하기 위해 기꺼이 속일 줄 알았고, 그 욕망의 중심에는 ‘복의 계승자’가 되고자 하는 집요한 열망이 있었다. 그 열망이 자리 잡은 곳이 바로 그의 허리였다. 다른 것은 포기할 수 있어도, 그 자리만큼은 내줄 수 없었다.
그러나 얍복강에서 그 자리가 꺾였다. 더 이상 힘으로 버틸 수 없게 되었을 때, 야곱은 마침내 붙들렸다. 그 순간 그의 이름이 바뀌었다. 사기꾼에서 이스라엘로. 자기 힘으로 쌓아 올리던 삶이 끝나고,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어 서는 삶이 시작되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그 무너진 허리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한 나라의 시작을 이야기하면서, 예렠 야곱—야곱의 허리에 대한 기억으로 서문을 연다. 더 이상 무엇도 낳을 수 없다고 여겨진 자리에서, 칠십 명의 이름이 태어났다. 구원의 씨앗은 언제나 그렇게, 가능성이 사라진 곳에서 움튼다.
그 허리는 연약했다. 그러나 그 연약함에서 민족이 태어났고, 왕들이 나왔다. 사람은 강함으로 강함을 제압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약함을 통해 강함을 드러내신다.
찢긴 자리에서 이어진 계보
무너진 야곱의 허리에서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졌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히브리어 예렠은 허리를 뜻하면서 동시에 옆구리를 가리킨다. 직접적인 동일시는 아니지만, 이 언어의 겹침은 성경 전체에 하나의 신비로운 방향성을 남긴다.
예수의 옆구리가 창에 찔렸을 때,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요 19:34). 죽음을 확인하기 위한 상처였지만, 그 자리에서 오히려 생명이 흘렀다. 야곱의 무너진 허리에서 나온 칠십 명이 한 민족을 살렸다면, 찢긴 예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은 온 인류를 살렸다. 출애굽기의 서문은 이미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구원은 언제나 파산한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나 그런 자리는 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으며, 울음 말고는 남아 있지 않은 자리. 나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다. 어린 시절, 가정이 아닌 공간에서 자라며 세상의 가장자리에 앉아 있던 날들이었다. 어머니는 멀리 계셨고, 마음대로 연락할 수도 없었다. 한겨울, 얇은 옷차림으로 낯선 도시를 헤매다 마침내 어머니가 머물던 작은 교회를 찾았던 날이 있었다. 예배당 의자를 침대 삼아 지내던 그 공간은 가난했고, 우리는 서로를 충분히 위로할 말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
다시 돌아오는 길, 아무도 곁에 없다고 느끼며 버스터미널 한쪽에 앉아 오래 울었다. 그때 내 안에 남은 것은 분노도 원망도 아니었다. 설명할 수 없는 한 문장이었다. ‘보고 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감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말 하나로 다시 숨을 쉴 수 있었다. 출구는 보이지 않았지만, 붙들림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이민에는 두 종류가 있다. 국경을 넘어 삶의 자리를 옮기는 지리적 이민이 있고, 자신이 붙들고 있던 세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영적 이민이 있다. 출애굽은 언제나 두 번째 의미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야곱의 무너진 허리에서 그랬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구원의 출구는 가장 단단하다고 믿어왔던 것이 꺾인 자리, 가장 약하다고 여겼던 그 지점에서 이미 열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 히브리어 성서 전통에서 각 책의 명칭은 대개 첫 단어를 따라 불렸다. 우리가 ‘출애굽기’라 부르는 이 책 역시 오랫동안 첫 문장에 따라 쉐모트(Shemot, ‘이름들’)로 불려 왔다. 오늘 익숙한 ‘출애굽기’(Exodus)라는 명칭은 기원전 3세기경 칠십인역 번역 과정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헬라어 제목이다. 이 차이는 이 책을 거대한 ‘사건의 연대기’로 읽을 것인가, 아니면 이름과 기억으로 형성된 공동체의 이야기로 읽을 것인가라는 해석의 방향과 맞닿아 있다.
출애굽기 해석을 둘러싼 논의 역시 이 물음 위에서 전개되어 왔다. 게르하르트 폰 라드는 출애굽을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적 ‘구원 사건’으로 읽었고, 이후 클라우스 베스터만과 브레바드 차일즈는 이를 정경 안에서 형성된 신앙의 기억으로 재조명했다. 월터 브루그만은 출애굽기를 제국의 질서에 맞서는 대안적 상상력의 서사로 읽으며, 이 이야기가 언제나 동시대의 권력과 긴장 속에 놓여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흐름은 출애굽기를 기적의 연속이 아니라, 공동체가 자기 정체성을 다시 배우는 문지방의 텍스트로 읽게 만든다.
조원태 목사 / <뉴욕우리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