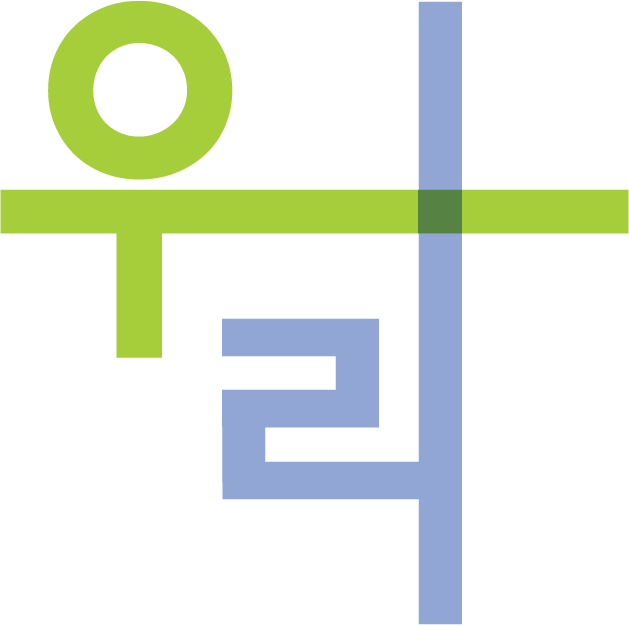연재글 [문지방에서 시작되는 큰 이야기]창조, 세계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창세기 1:1-2 (뉴스앤조이) 2026-1-15
페이지 정보

본문
창조, 세계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조원태목사의 [문지방에서 시작되는 큰 이야기]
창세기 1:1–2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조원태 목사
조원태 목사 성서를 펼칠 때 우리는 대개 서둘러 이야기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이야기의 전개, 인물의 드라마, 교훈과 메시지를 찾기 위해서다.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마주치는 문장은 너무 익숙하다는 이유로 빠르게 통과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서의 첫 문장은 종종 출입문이 아니라 복도처럼 취급된다. 그러나 성서는 이 문장을 통과하지 않고는 단 한 걸음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시작된다. 이 책의 서문은 성서의 안쪽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독자를 세워 두는 문지방이다.
왜 이 책은 이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이 자신을 먼저 구원자로 소개하지 않고, 율법의 주인이나 역사의 심판자로 드러내지 않고, 굳이 창조자로 등장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성서는 처음부터 인간의 문제를 다루기보다, 세계의 성격을 먼저 규정한다.
성서의 적지 않은 책들은 애초에 ‘설명’이 아니라 ‘첫 단어’로 자신을 소개했다. 이야기의 문을 여는 그 첫 단어가 곧 책의 이름이 되었기 때문이다. 창세기도 예외가 아니다. 이 책의 가장 오래된 이름은 ‘태초에(히브리어 베레시트)’였다.
우리는 이미 제목에서부터, 사건이 아니라 세계의 시작 앞에 세워진다. 이 세계는 우연이 아니라 의도이며, 방치가 아니라 관계 속에 놓여 있다는 선언이다. 이 책의 첫 문장은 짧지만, 성서 전체의 방향을 결정한다.
성서는 세계가 완성된 모습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혼돈과 공허, 그리고 빛을 만들어 낼 힘이 없는 어둠으로 시작한다. 주목할 것은 그 위에 무엇이 있었는가다. 아무것도 아직 형태를 갖추지 못한 그 자리 위에, 하나님의 영은 이미 머물며 운행하고 있었다. 창조는 충만함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부재의 순간에도 철회되지 않은 하나님의 관심에서 시작된다.
창조라는 이름의 세계관
‘창조’라는 두 글자는 창세기를 요약하는 주제이자, 성서 전체를 떠받치는 중심축이다. 창세기에서 요셉 이야기까지 이어지는 긴 서사는 파괴와 실패를 거듭하지만, 매 순간 하나님이 그 세계를 다시 살리고 지켜 내시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창조는 첫 장에만 머무는 사건이 아니라,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며 세계가 끝내 포기되지 않았음을 증언하는 숨은 동력이다. 성서가 말하는 창조는 그래서 단지 세계의 기원을 설명하는 이론에 머물지 않는다.
창조는 세계관의 선언이다. 이 세계는 신들의 전쟁터가 아니며, 자연의 우연한 부산물도 아니고, 인간이 마음대로 점유할 수 있는 소유물도 아니다. 창조는 말한다. 이 세계에는 의미가 있고, 질서가 있으며, 방향이 있다고. 무엇보다 이 세계는 관계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로 시작되었다고.
이 책이 처음 세계를 말하는 방식은 다르다. 하나님은 싸우지 않는다. 고대 근동의 신화들처럼 혼돈의 괴물을 처단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말씀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고 세계는 응답한다. 창조는 노동의 산물이 아니라 말씀의 사건이다. 폭력의 결과가 아니라, 언어의 질서 속에서 태어난 세계다. 이 한 장면만으로 성서는 어떤 책인지 드러난다.
성서는 힘의 신화를 거부하고, 말씀이 세계를 세운다는 대안적 세계를 제시한다. 이 고백은 안정된 자리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 창세기의 첫 문장은 주권을 상실한 공동체의 언어다. 이집트의 노예였거나,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들이, 세계의 시작을 다시 말해야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예의 시간과 포로의 시간 속에서, 세계를 설명하는 제국들이 있었다. 하늘과 빛, 바다와 별들은 신의 이름으로 불렸다. 그러나 이 책의 첫 장은 그 이름들을 모두 내려놓는다. 하늘도, 빛도, 큰 바다 생물도 신이 아니라 창조된 존재로 다시 배치된다. 이것은 우아한 철학이 아니라 억압 속에서 길어 올린 신앙 고백이다. 주권을 빼앗긴 이들이, 세계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말하는 방식이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창조의 리듬이다. 빛과 어둠, 물 위와 물 아래, 저녁과 아침. 창조는 무질서를 제거하는 작업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아주는 일이다. 혼돈은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질서로 초대된다. 그래서 인간은 마지막에 등장한다. 정복자로가 아니라 관리자로, 소유자로가 아니라 청지기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인간이 신의 자리를 대신 차지했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을 대신해 세계를 돌볼 책임을 부여 받았다는 선언이다. 창세기의 인간 이해는 처음부터 관계적이고 윤리적이다.
구원 이전의 창조
이 서문은 창세기 전체의 복선으로 작동한다. 이야기는 곧 어두워진다. 타락, 형제 살해, 홍수, 바벨탑. 그러나 성서는 이 연속된 실패를 창조의 실패로 해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을 부르고, 요셉을 남겨두며, 이스라엘을 선택한다.
이유는 분명하다. 이 세계는 여전히 창조된 세계이기 때문이다. 출애굽은 창조의 연장이며, 율법은 창조 질서의 사회적 번역이다. 예언은 그 질서가 훼손될 때 울리는 경고음이다. 그리고 복음서가 말하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 세계를 새롭게 여는 창조의 시작으로 제시된다.
이 첫 장이 없다면 복음은 쉽게 개인의 내면 문제로 축소된다. 성서를 오랫동안 구원의 이야기로 읽어 온 전통 속에서, 이 첫 장은 너무 빨리 통과되어 왔다. 그러나 성서는 구원을 말하기에 앞서, 세계가 무엇인지, 인간의 삶이 어떤 자리에 놓여 있는지를 먼저 묻는다.
그럴수록 성서의 문지방에 ‘창조’가 놓일 때, 복음은 세계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가 된다. 성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를 포기하지 않는다. 구원은 창조의 반대가 아니라, 창조를 끝까지 책임지는 방식이다.
오늘 우리는 세계를 너무 쉽게 소비한다. 사람을 기능으로 평가하고, 자연을 자원으로 환원한다. 그 결과는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다. 관계의 파괴, 생태의 위기, 인간성의 소진. 세계가 자원으로만 취급될 때, 가장 먼저 비용이 되는 것은 늘 약한 존재들이다.
창세기 1:1-2는 오늘의 독자에게 직접적인 해답을 주기보다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이 세계를 어떤 눈으로 살고 있는가. 당신의 삶은 창조의 연장인가, 아니면 훼손의 반복인가.
이 질문은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려는 독자를 문지방에 잠시 멈춰 세운다. 성서의 첫 문장은 이미 지나간 과거형이 아니다. 창조는 지금도 진행 중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서 여전히 묻고 있다.
이제 다시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 아니면 아직 문지방에 더 서 있어야 하는지를.
조원태 목사 / <뉴욕우리교회>
※ 이 글의 문제의식은 구약성서 신학에서 구원사를 중심으로 성서를 이해했던 게르하르트 폰 라드 이후, 창조를 성서 신학의 토대로 재조명하려 한 클라우스 베스터만과 브레바드 차일즈, 그리고 구원사 중심 해석을 비판한 제임스 바 등의 논의를 배경으로 한다. 덧붙여 창세기의 히브리어 본래 명칭은 첫 단어인 ‘태초에(베레시쓰)’였으며, ‘창세기(Genesis)’라는 제목은 기원전 3세기경 칠십인역 번역 과정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 이전글2026년 1월 18일 26.01.18
- 다음글문지방에서 시작되는 큰 이야기 (뉴스앤조이) 2026-1-9 26.01.15